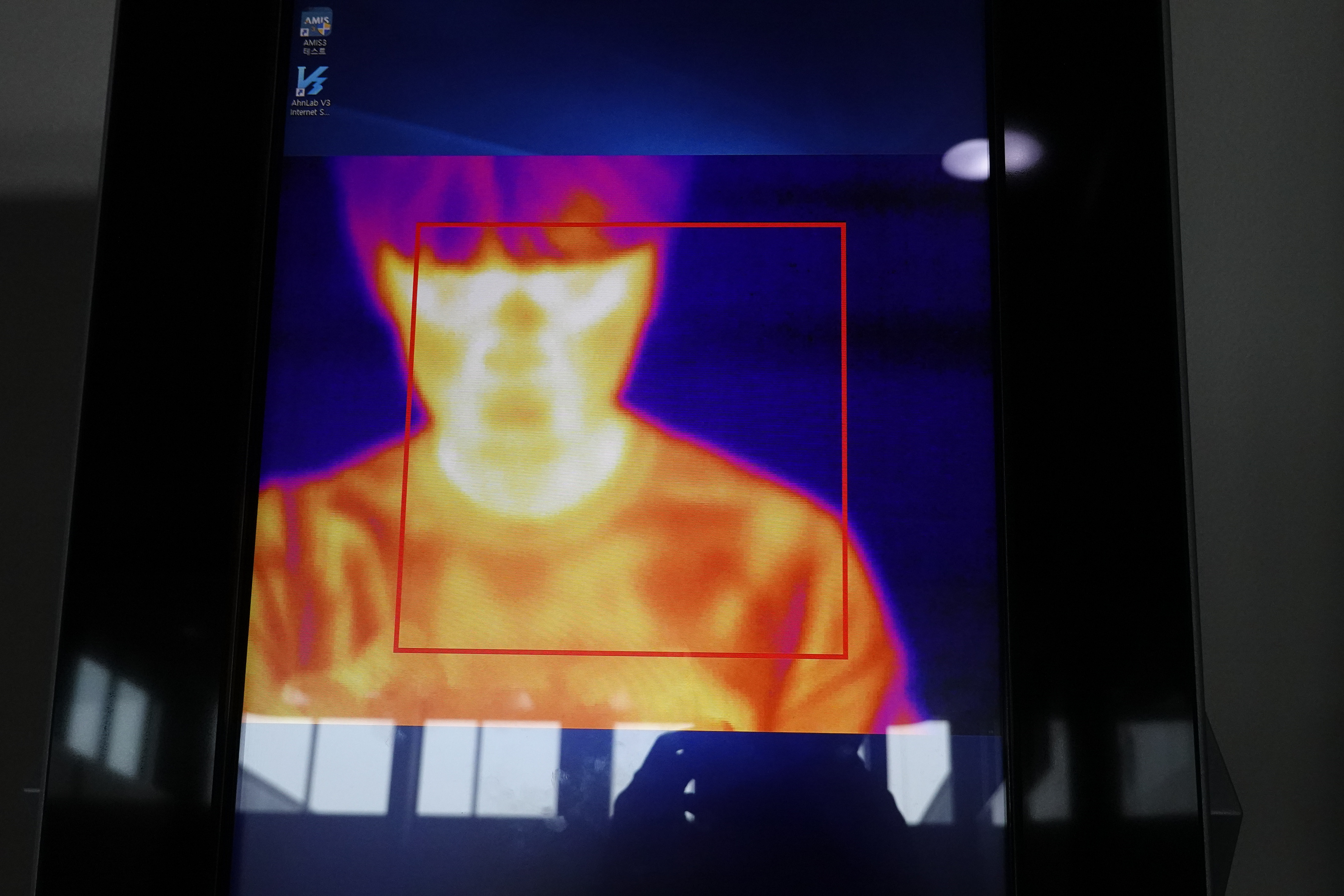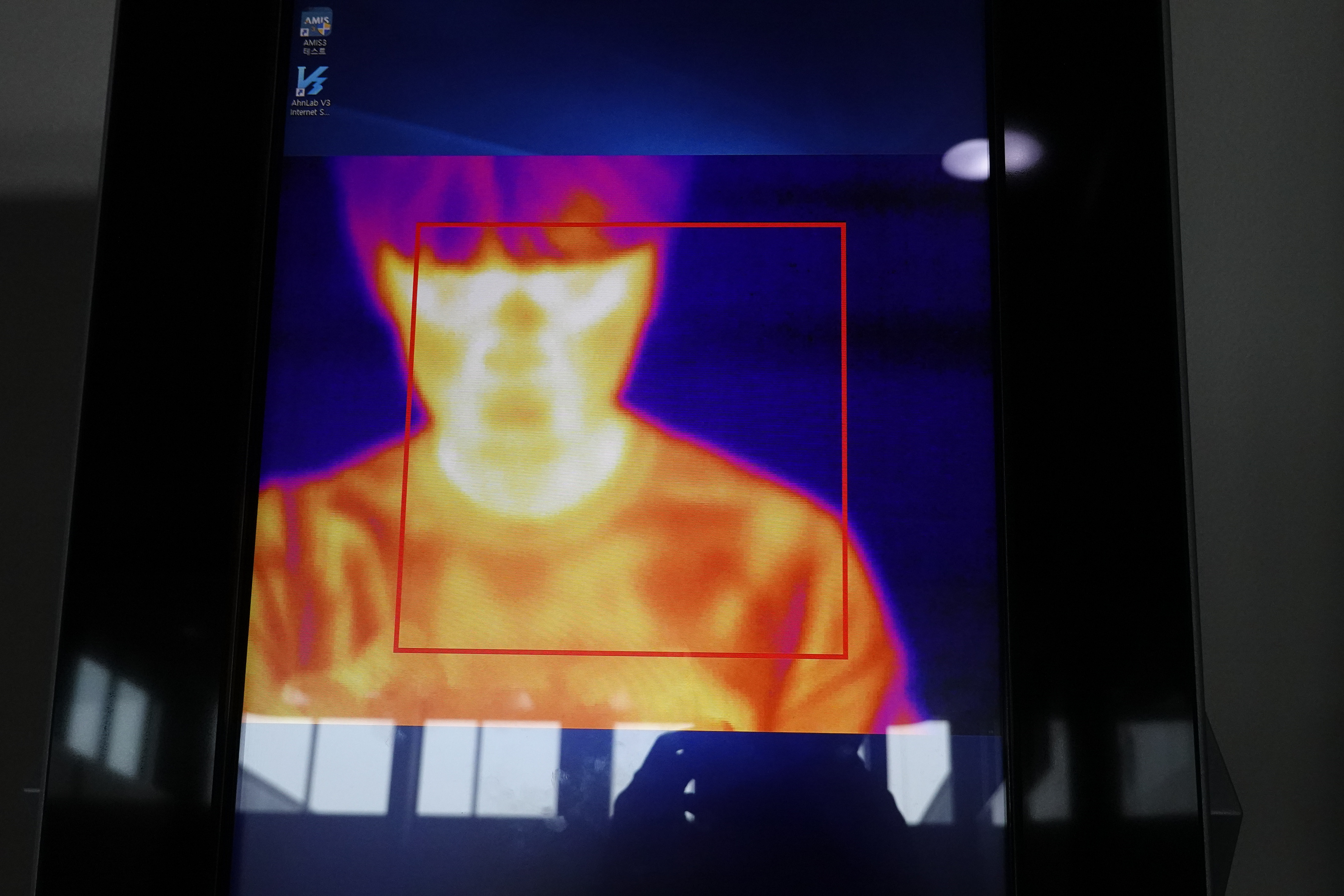















5월 3일 그날 일은 사고였다. 확률에 근거한 사고같은 일이었다. 예방할수 없는 아주 생경한 사고였다. 운전을 하며 사방의 거울을 보며 혹시나 자의 타의에 의해 일어날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며 지금까지 사고를 예방해 왔다면, 그날 그 일은 그냥 뭐하나 대비할수 없는 그런 사고였다. 그런 사고가 있다. 새벽이가 24주 6일만에 태어났다. 절망적이었다. 사진은 늘 찍어 왔던 것이라 꼭 그날부터 찍어왔던건 아녔다. 하지만 그날부터 찍은 사진은 달랐다. 절망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희망의 기호를 읽으려 했다. 있으면 있는데로 없으면 없는대로 간절함을 담아 매일 사진을 찍어서 프실린트를 했다. 나만의 기도였다. 새벽이가 태어난지 몇일 됬을때 완전 밀봉된 셀러드에서 살아있는 개미가 나왔다. 평소였다면 기분나빴을 그것이 나에겐 다른 의미 였다. 사진을 정성껏 찍고 화단에 옮겨 주었다. 그날부터 본능적으로 영상도 남겼다. 편집은 할줄 모르지만 사진만으로 부족해 영상을 틈틈히 남겼다. 그렇게 남긴 영상들은 새벽이 두돌이 지나서 정리를 해 유튜브를 통해 정리 했다. 어느 덧 새벽이가 만 4살이 넘었다. 어느날 사진을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다. 그동안 쌓인 사진을 하루종일 보며 사진을 골랐다. 하루 하루 폴더별로 정리 되어있던 사진들이 2019년 5월 3일만 비어있다. 그날을 전으로 찍힌 사진을 보니 깊은 마음속 옅어진 흉터가 다시 욱신거렸다. 내가 그날로 돌아간다면, 새벽이가 더 온전히 태어날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 하루 하루 평화로운 과거의 순간들로 차있는 사진 폴더들이 그 날이 가까워 온다고 긴장감이 넘치진 않았다. 그저 셔터를 누른 그 순간들이 너무 평화로워서 그리고 그 안에 웃고있는 아내의 얼굴이 너무 슬펐다. 그리고 5월 3일은 찍지 못했다. 5월 4일부터 나는 사진을 다시 찍었다. 직업이 직업인지라, 5월 3일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기 전에 최대한 자세히 글로 남겨놓았다. 그날부터 꾸준히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